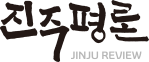진주교방문화의 멋과 맛을 찾아서
진주를 비롯한 경남의 여러 도시들이 문화도시(文化都市)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 부재로 인해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구축에 실패하고 있다. 사실상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각종 문화 관련 시설 공급에 스스로의 역할을 한계 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특성과 역사성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의 장기플랜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진주의 교방문화(敎坊文化)는 그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이른바 ‘기생문화’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그 가치가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진주교방문화가 갖고 있는 정신·예술사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전승과 보전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진주 교방문화의 멋과 맛을 오롯이 담아낸 ‘진주교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진주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년 기획 ‘진주교방문화의 멋과 맛을 찾아서’가 진주가 새로운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편집자주>
1. ‘진주교방문화단지’ 조성과 문화도시 도약
2. 교방문화의 멋과 맛이 남긴 미래가치
3. 진주교방문화의 역사와 문화·예술적 평가
4. 진주교방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과제와 전망
2. 교방문화의 멋과 맛이 남긴 미래가치
진주교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정체성에 기반을 둔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하다. 실제로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문화 콘텐츠 개발은 기존의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하거나, 문화자원이 가지는 가치(價値)를 이식(移植)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진주교방문화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과 문화적 가치의 이식이라는 두 측면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진주교방문화를 통해 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의 개발은 물론 이를 통한 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와 먹거리 산업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미래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진주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都市再生事業)에서 문화·예술·역사가 화두(話頭)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주교방문화의 멋과 맛이 남긴 미래가치’에 대해 주목하는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문화와 예술이 도시를 재생하고, 창의성과 독창성을 지닌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근거를 진주교방문화에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방문화의 풍류와 멋, 의암별제
진주교방문화의 풍류와 멋은 의기(義妓) 논개(論介)를 추모하는 성대한 대동제 성격의 의암별제(義巖別祭)와 진주권번에서 계승된 진주검무(晋州劍舞)를 비롯한 전통 가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진주교방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단연 의암별제(義巖別祭)이다. 의암별제는 고종 5년인 1868년 당시 진주목사인 정현석(鄭顯奭)에 의해 창설되었다. 의암별제는 매년 음력 6월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기녀들만이 치른 대규모 의식으로, 악공을 제외한 제관(祭官) 등 모든 의식(儀式)을 여성들이 주관하는 점과 선비들의 음악인 정악(正樂)을 사용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는 행사이다.
첫 제례가 베풀어진 무진년(戊辰年)에는 300여 명의 기녀들이 모인 가운데 악가무(樂歌舞)가 어우러진 성대한 제례가 행해졌고, 무려 3일 동안 베풀어진 여흥잔치에는 수천 명의 구경 인파가 몰려 가히 장관이었다고 전해진다.
의암별제는 그 의식(儀式) 자체가 갖는 민족성 때문에 진주의 노소명기(老少名妓)와 시민들의 의식 발로로 일제강점기에도 한두 차례 봉행 되다가 결국 단절이라는 아픔을 겪지만,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노력에 힘입어 1992년 진주성 촉석루에서 의암별제 복원과 봉행이 거행된다. 의암별제의 복원과 봉행은 논개의 민족적 충혼을 오늘에 되살리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일임과 동시에 나아가 민족의 정체성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민족적인 쾌사(快事)라는 가치를 지닌다.
의암별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가치는 조선 시대 종묘(宗廟)에서 행해진 종묘대제(宗廟大祭)나 문묘(文廟)에서 제사를 지내는 석전대제(釋奠大祭)를 제외하고서 의암별제처럼 음악과 노래, 춤이 어우러진 제사의식을 치른 전례가 없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 진주교방문화가 가진 역사성과 정체성, 독창성을 계승하는 진주만의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2018 진주 논개제 당시 봉행된 의암별제 광경.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가 주최한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대표 프로그램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의암별제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하여 진주교방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
진주의 봄축제인 2018년 진주논개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의암별제가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대표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시 의암별제는 의암별제 창설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1868년 그날’이라는 주제로 진주검무 이수자들과 진주지역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당상악공, 당하악공 등이 제례에 참여하는 종합가무제로 창설 그 당시 그대로 재현한 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역사적 사실 재현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의암별제의 대표 프로그램상 수상은 그 의미가 깊고,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공예·민속예술창의도시 지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일각에서 대한민국 축제의 원조가 ‘의암별제’라는 주장이 제기된 적도 있다. 동의한다면 의암별제가 창제된 1868년을 기점으로 진주의 축제는 151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갖게 된다. 축제도시 진주를 표방하는 진주시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더불어 의암별제가 지닌 가치의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암별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감안한다면 무형문화재 지정은 당연한 일이다. 의암별제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진주교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교방의 악가무가 지닌 전통의 향기
의암별제와 더불어 진주교방문화의 핵심은 진주검무를 비롯한 전통가무(傳統歌舞)에 있다. 진주권번에서 계승된 진주의 궁중무와 민속무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춤으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시·도문화재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인 진주검무(晋州劍舞)이며,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인 한량무(閑良舞),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인 진주포구락무(晋州抛毬樂舞),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인 진주교방굿거리춤 등이다.
이처럼 진주권번이 계승한 전통춤들은 우리나라 무용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요리집 여흥거리로만 인식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기녀들의 춤을 악(樂)의 총체적 개념 속에서 보지 못하고, 여기(餘技)에 부속된 것으로만 인식되었던 탓이다.
진주교방에서 진주권번으로 이어진 기녀들의 춤에 대한 인식 여부를 떠나 당대에는 엄연히 우리 춤의 주역이었고, 우리 춤의 중심이었다는 점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기녀들의 춤 속에는 수백,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길러지고 다듬어진 우리 춤의 정신이 담겨있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를 중심으로 진주교방문화 혹은 진주권번문화의 예술문화사적인 가치가 계승·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방문화의 맛, 진주냉면과 교방음식
진주교방문화가 가진 문화 콘텐츠 가운데 교방음식(敎坊飮食)은 조선 중기의 음식문화의 꽃을 피웠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교방음식의 재발견과 창조적 계승 노력은 진주교방문화 활성화에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방음식은 진주교방청의 연회음식에서 비롯된 한정식(韓定食)을 지칭한다. 조선 시대에는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오면 그들을 접대하기 위한 연회가 베풀어졌고, 이 자리에서 기생들의 가무와 술이 곁들여진 진주교방청의 연회음식이 곧 교방음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예로부터 진주는 서부경남의 교통 중심지로 지리산의 청정 농산물과 남해바다의 신선한 수산물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산해진미의 음식문화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다.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진주교방음식은 타지역들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교방이 폐쇄되면서 교방문화와 더불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고, 교방음식과 상차림은 일부 한정식 식당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교방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주냉면이다. 진주의 기녀들이 새참으로 진주냉면을 먹었다는 전술(傳述)도 있지만, 진주의 권력가나 재력가들이 야참음식으로 즐겨 먹었는데, 조리하는 방식도 독특해 진주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진주포구락무. 진주권번에서 계승된 진주의 궁중무와 민속무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춤으로 남아 무용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녀의 춤으로 인식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진주포구락무

진주교방굿거리춤

한량무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고려 시대부터 메밀을 이용한 메밀국수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 이르면 ‘냉면 중에 제일로 여기는 것은 평양냉면과 진주냉면이다’라고 할 만큼 평양과 진주지방에서 냉면이라는 명칭으로 정착, 발전하였다.
디지털진주문화대전에 따르면 진주냉면은 1960년대 중반에 진주지역에서 사라졌다가, 1999년 진주냉면 원형을 중심으로 식생활문화연구가에 의해 재현되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옥봉동을 중심으로 수정식당, 평화식당, 은하식당 등 7~8개 업소가 성업 중이었으며, 옛날에는 이러한 식당들이 하인을 두고 직접 배달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주냉면이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진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북한의 평양냉면과 같은 명성과 유명세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가능하다면 진주교방문화단지 조성을 통한 진주냉면의 전국적인 홍보와 전략적인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암별제를 비롯한 진주의 전통가무의 계승·발전은 기존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다. 그리고 진주교방청에서 유래한 교방음식과 진주냉면의 문화 콘텐츠화는 지역의 먹거리 산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진주교방문화의 멋과 맛이 남긴 미래가치이다. 정작 문제는 진주교방문화와 교방음식을 진주만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부재에 있다.
이제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방문화가 갖는 미래가치를 인식하고, 진주문화의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이어져야 한다. 더불어 진주교방문화의 풍류와 멋이 지닌 진주만의 전통문화의 홍보와 전승은 물론 진주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계승할 수 있는 각계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진주교방문화가 갖고 있는 풍류와 멋은 진주만의 것이기 때문이다.